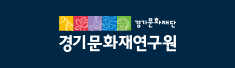추연우성전묘역(우하영묘역포함)
秋淵禹性傳墓域(禹夏永墓域包含)
秋淵禹性傳墓域(禹夏永墓域包含)
| 지정구분 | 도지정문화재 |
|---|---|
| 종목 및 지정번호 |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1호 |
| 명칭(한자) | 추연우성전묘역(우하영묘역포함) (秋淵禹性傳墓域(禹夏永墓域包含)) |
| 유형분류 | 유적건조물 |
| 지 정 일 | 2003-04-21 |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 78-1, 71-1 지도로 보기 |
| 시 대 | 조선시대 |
추연우성전묘역(우하영묘역포함)(秋淵禹性傳墓域(禹夏永墓域包含))은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21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78-1번지, 산71-1번지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인 우성전(禹性傳 : 1542~1593)과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우하영(禹夏永 : 1741~1812)을 모신 유택이다.
우성전의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경선(景善), 호는 추연(秋淵)이다. 퇴계의 문인으로 1561년(명종 16년)에 진사가 되고, 1568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예문관검열·예문관 봉교·홍문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1592~1598)이 일어나자 경기도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군호(軍號)를 추의군(秋義軍)이라 하고 식량을 조달하여 난민을 구제하였다. 강화도에 들어가서 김천일(金千鎰 : 1537~1593)과 합세하여 전공을 세우고 강화도를 장악하여 남북으로 통하게 하였다. 그 뒤 여러 전과를 남겼으나 과로로 병을 얻어 경기도 부평에서 사망하였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우하영은 우성전의 7대손으로 자는 대유(大猷), 호는 취석실(醉石室)이다.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고 사회실정을 체험하는 한편 옛 문헌과 당대 제가들의 논설을 널리 읽고 수집하여 국가·사회의 경영 및 개혁방안을 종합 저술하였는데 그것이 『천일록(千一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전제(田制)·군제·국방·관제·농업 기술문제 등에 관한 그의 독창적인 사상과 정책을 기술한 것이다. 1796년(정조 20년) 조정의 구언교서(求言敎書)가 내리자 그는 이를 간추려 정리하여 책자로 만들어 바쳤고, 1804년(순조 4년)의 구언 때 이를 다시 보완하여 『천일록』이라는 제명으로 조정에 상정하였다.
우성전 묘역의 봉분은 쌍분으로 부인 양천허씨(陽川許氏)와의 합장묘이다. 묘역의 석물로는 묘비 1기, 상석·향로석 각 1기, 망주석 2기가 있고, 묘역에 이르는 도로 입구에 신도비 1기가 있다.
봉분 앞의 묘비는 원수방부(圓首方趺)의 형태이다. 묘역에 이르는 도로 입구에 있는 신도비는 옥개석(屋蓋石)·비신(碑身)·기대(基臺)로 구성되어 있다. 비신의 4면에 기록이 있으며 비신의 상단에 돌려가며 전액(篆額)을 ‘추연선생시문강우공신도비명(秋淵先生諡文康禹公神道碑銘)’이라 횡서로 쓰여 있다. 비문은 성호(星潮) 이익(李瀷 : 1681~1763)이 찬(撰)한 글을 먼저 새기고, 7대손 우하영의 부탁으로 추기(追記)한 글을 뒤에 기록하였다. 글씨와 전액은 이상천(李相天)이 쓴 것으로 1878년(고종 15년)에 건립한 것이다.
한편, 우하영 묘역은 우성전 묘역과는 직선거리로 약 50m 떨어진 숙곡리 산71-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은 쌍분으로 부인 평산신씨(平山申氏)와의 합장묘이다. 묘역에는 쌍분만 조성되어 있고, 일체의 석물이 없다.
(자료출처 :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1』)
내용 더보기
※ 아래내용 출처 : 화성문화원
<우성전 묘 석물현황(단위:㎝)>
– 묘 표 : 비신높이 141, 폭 50, 두께 21
– 개 석 : 높이 23, 폭 84, 두께 52
– 신도비 : 비신높이 186, 폭 66.5, 두께 35.5
– 비 좌 : 높이 26, 폭 112, 두께 69
– 개 석 : 높이 54, 폭 106, 두께 74
– 망주석 : 높이 142, 가로 31, 세로 32
– 상 석 : 높이 22, 가로 120, 세로 74
– 향로석 : 가로 25, 세로 22.5, 높이 39
<우성전 묘표>
전면 : 유명조선국증자헌대부이조판서홍례문대제학행대사성지제교익문강단양우공휘성전묘 배 증정부인양주허씨 좌 원신(有明朝鮮國贈資憲大夫吏曹判書弘禮文大提學行大司成知製敎謚文康丹陽禹公諱性傳墓 配 贈貞夫人楊洲許氏 左 原申)
<우성전 신도비>
비제(碑題) : 증자헌대부이조판서겸홍지경연의금부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지춘추관성균관사오위도총부총관행통정대부성균관대사성지제교익문강우공신도비명병서(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弘知經筵義禁府弘文官大提學禮文官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莩摠管行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知製敎謚文康禹公神道碑銘幷書)
찬(撰): 우하영(禹夏永, 1741~1812) 서(書): 이상천(李相天, ?~?) 전(篆): 이상천(李相天?~?)
건립연대: 우성전 사후 오년 뒤(公沒後五 己卯 二月 立(1879)
※ 아래내용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홈페이지)
우성전(禹性傳)
생몰연대 : 1542(중종 37)∼1593(선조 26).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경선(景善), 호는 추연(秋淵)·연암(淵庵). 환(桓)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승사랑(承仕郞) 성윤(成允)이고, 아버지는 현령 언겸(彦謙)이며, 대사헌 허엽(許謙)의 사위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61년(명종 16) 진사가 되고, 1564년 성균관 유생들을 이끌고 요승 보우(普雨)의 주살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1568년(선조 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예문관검열·봉교(奉敎), 수찬(修撰) 등을 거쳐 1576년 수원현감으로 나가서는 명망이 높았다. 한때 파직되었다가 다시 장령(掌令)·사옹원정을 거쳐 1583년에 응교(應敎)가 되고 뒤에 여러번 사인(舍人)을 지냈다.
동서분당 때 동인으로 분류되었고, 그 뒤 이발(李潑)과 틈이 생기자 그는 남산에 살아서 남인, 이발은 북악(北岳)에 살아서 북인으로 분당되었다. 남인의 거두로 앞장을 섰으며, 동서분당 때나 남북의 파쟁에 말려 미움도 사고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1591년 서인인 정철(鄭澈)의 사건에 연좌되어 북인에게 배척되고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풀려나와 경기도에서 의병을 모집해 군호(軍號)를 ‘추의군(秋義軍)’이라 하고 소금과 식량을 조달해 난민을 구제하였다. 또한 강화도에 들어가서 김천일(金千鎰)과 합세해 전공을 세우고 강화도를 장악해 남북으로 통하게 하였다. 병선을 이끌어 적의 진격로를 차단했으며, 권율(權慄)이 수원독성산성(禿城山城)에서 행주에 이르자 의병을 이끌고 지원하였다.
그 공으로 봉상시정에서 대사성으로 서용되었다. 그 뒤 계속 활약, 용산의 왜적을 쳐서 양곡을 확보해 관군과 의군의 식량을 마련하였다. 그 뒤 퇴각하는 왜군을 경상우도 의령까지 쫓아갔으나 과로로 병을 얻어 경기도 부평에서 사망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계갑록(癸甲錄)>·<역설(易說)>·<이기설(理氣說)> 등이 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우하영(禹夏永)
생몰연대 : 1741년(영조 17)∼1812년(순조 12).
경기도 수원 출신.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대유(大猷), 호는 취석실(醉石室). 아버지는 정서(鼎瑞)이며, 큰아버지 정태(鼎台)에게 입양되었다.
1755년(영조 31)부터 과거공부를 시작하여 여러 번 응시했으나 회시(會試)에서만 12번 낙방하는 등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당시 만연했던 과거 부정이나 관직 구걸 운동을 마다하고 시골의 유생으로 평생을 보낸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촌 지식인이었다. 그는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고 사회실정을 체험하였으며, 옛 문헌과 당대 제가들의 논설을 널리 읽고 수집하여 국가·사회의 경영 및 개혁 방안을 종합한 <천일록(千一錄)>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전제(田制)·군제·국방·관제·농업기술 문제 등에 관한 그의 독창적인 사상과 정책을 기술한 것이다.
1796년(정조 20) 조정의 구언교서(求言敎書)가 내리자 그는 이를 정리하여 책자로 만들어 바쳤다. 1804년(순조 4)의 구언 때 이를 다시 보완하여 <천일록>이라는 제명으로 조정에 상정했으나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전자는 ‘수원유생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이라는 제명으로, 후자는 ‘천일록’이라는 표제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의 사회·경제사상의 핵심은 권농 정책에 있었다. 그는 권농관(勸農官)의 설치, 권농 절목 마련, 농서 반포, 수차(水車) 보급, 양전과 조세의 공평, 농지 확장 등을 주장했고, 무위도식자나 부유자(浮遊者)를 엄벌할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그는 상업적 농업과 시장 경제에 의한 정당한 이윤 추구를 인정했고, 공명첩(空名帖)에 의한 부농의 신분 상승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농민층의 분화에 의한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를 우려했고, 상민들의 양반 멸시를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의 광작(廣作) 농업 경영을 비판하고, 화성장시(華城場市)에서 외부 행상의 금절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실학적 근대성의 단면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전통적 양반 사회의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의 광범위하고 창의적인 개척 정책은 당시 농촌 지식인들의 의식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국가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하였다.
<우성전 묘 석물현황(단위:㎝)>
– 묘 표 : 비신높이 141, 폭 50, 두께 21
– 개 석 : 높이 23, 폭 84, 두께 52
– 신도비 : 비신높이 186, 폭 66.5, 두께 35.5
– 비 좌 : 높이 26, 폭 112, 두께 69
– 개 석 : 높이 54, 폭 106, 두께 74
– 망주석 : 높이 142, 가로 31, 세로 32
– 상 석 : 높이 22, 가로 120, 세로 74
– 향로석 : 가로 25, 세로 22.5, 높이 39
<우성전 묘표>
전면 : 유명조선국증자헌대부이조판서홍례문대제학행대사성지제교익문강단양우공휘성전묘 배 증정부인양주허씨 좌 원신(有明朝鮮國贈資憲大夫吏曹判書弘禮文大提學行大司成知製敎謚文康丹陽禹公諱性傳墓 配 贈貞夫人楊洲許氏 左 原申)
<우성전 신도비>
비제(碑題) : 증자헌대부이조판서겸홍지경연의금부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지춘추관성균관사오위도총부총관행통정대부성균관대사성지제교익문강우공신도비명병서(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弘知經筵義禁府弘文官大提學禮文官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莩摠管行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知製敎謚文康禹公神道碑銘幷書)
찬(撰): 우하영(禹夏永, 1741~1812) 서(書): 이상천(李相天, ?~?) 전(篆): 이상천(李相天?~?)
건립연대: 우성전 사후 오년 뒤(公沒後五 己卯 二月 立(1879)
※ 아래내용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홈페이지)
우성전(禹性傳)
생몰연대 : 1542(중종 37)∼1593(선조 26).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경선(景善), 호는 추연(秋淵)·연암(淵庵). 환(桓)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승사랑(承仕郞) 성윤(成允)이고, 아버지는 현령 언겸(彦謙)이며, 대사헌 허엽(許謙)의 사위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61년(명종 16) 진사가 되고, 1564년 성균관 유생들을 이끌고 요승 보우(普雨)의 주살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1568년(선조 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예문관검열·봉교(奉敎), 수찬(修撰) 등을 거쳐 1576년 수원현감으로 나가서는 명망이 높았다. 한때 파직되었다가 다시 장령(掌令)·사옹원정을 거쳐 1583년에 응교(應敎)가 되고 뒤에 여러번 사인(舍人)을 지냈다.
동서분당 때 동인으로 분류되었고, 그 뒤 이발(李潑)과 틈이 생기자 그는 남산에 살아서 남인, 이발은 북악(北岳)에 살아서 북인으로 분당되었다. 남인의 거두로 앞장을 섰으며, 동서분당 때나 남북의 파쟁에 말려 미움도 사고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1591년 서인인 정철(鄭澈)의 사건에 연좌되어 북인에게 배척되고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풀려나와 경기도에서 의병을 모집해 군호(軍號)를 ‘추의군(秋義軍)’이라 하고 소금과 식량을 조달해 난민을 구제하였다. 또한 강화도에 들어가서 김천일(金千鎰)과 합세해 전공을 세우고 강화도를 장악해 남북으로 통하게 하였다. 병선을 이끌어 적의 진격로를 차단했으며, 권율(權慄)이 수원독성산성(禿城山城)에서 행주에 이르자 의병을 이끌고 지원하였다.
그 공으로 봉상시정에서 대사성으로 서용되었다. 그 뒤 계속 활약, 용산의 왜적을 쳐서 양곡을 확보해 관군과 의군의 식량을 마련하였다. 그 뒤 퇴각하는 왜군을 경상우도 의령까지 쫓아갔으나 과로로 병을 얻어 경기도 부평에서 사망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계갑록(癸甲錄)>·<역설(易說)>·<이기설(理氣說)> 등이 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우하영(禹夏永)
생몰연대 : 1741년(영조 17)∼1812년(순조 12).
경기도 수원 출신.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대유(大猷), 호는 취석실(醉石室). 아버지는 정서(鼎瑞)이며, 큰아버지 정태(鼎台)에게 입양되었다.
1755년(영조 31)부터 과거공부를 시작하여 여러 번 응시했으나 회시(會試)에서만 12번 낙방하는 등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당시 만연했던 과거 부정이나 관직 구걸 운동을 마다하고 시골의 유생으로 평생을 보낸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촌 지식인이었다. 그는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고 사회실정을 체험하였으며, 옛 문헌과 당대 제가들의 논설을 널리 읽고 수집하여 국가·사회의 경영 및 개혁 방안을 종합한 <천일록(千一錄)>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전제(田制)·군제·국방·관제·농업기술 문제 등에 관한 그의 독창적인 사상과 정책을 기술한 것이다.
1796년(정조 20) 조정의 구언교서(求言敎書)가 내리자 그는 이를 정리하여 책자로 만들어 바쳤다. 1804년(순조 4)의 구언 때 이를 다시 보완하여 <천일록>이라는 제명으로 조정에 상정했으나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전자는 ‘수원유생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이라는 제명으로, 후자는 ‘천일록’이라는 표제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의 사회·경제사상의 핵심은 권농 정책에 있었다. 그는 권농관(勸農官)의 설치, 권농 절목 마련, 농서 반포, 수차(水車) 보급, 양전과 조세의 공평, 농지 확장 등을 주장했고, 무위도식자나 부유자(浮遊者)를 엄벌할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그는 상업적 농업과 시장 경제에 의한 정당한 이윤 추구를 인정했고, 공명첩(空名帖)에 의한 부농의 신분 상승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농민층의 분화에 의한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를 우려했고, 상민들의 양반 멸시를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의 광작(廣作) 농업 경영을 비판하고, 화성장시(華城場市)에서 외부 행상의 금절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실학적 근대성의 단면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전통적 양반 사회의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의 광범위하고 창의적인 개척 정책은 당시 농촌 지식인들의 의식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국가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하였다.
[문헌목록]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